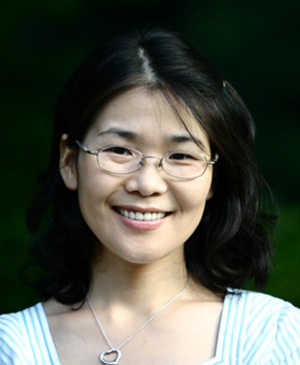 접시를 들고 음식 앞으로 간다. 잘 차려진 뷔페에서 평소 먹어보지 못한 맛깔스런 음식들을 바라보는 것은 저절로 입맛을 돌게 한다.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음식을 먹어봐야지, 집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부터 골고루 먹어야지, 그렇게 다짐한 마음과 행동은 언제나 엇갈린다. 어느새 내 접시에는 익숙한 음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접시를 들고 음식 앞으로 간다. 잘 차려진 뷔페에서 평소 먹어보지 못한 맛깔스런 음식들을 바라보는 것은 저절로 입맛을 돌게 한다.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음식을 먹어봐야지, 집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부터 골고루 먹어야지, 그렇게 다짐한 마음과 행동은 언제나 엇갈린다. 어느새 내 접시에는 익숙한 음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누군가 한마디 한다.
“짐 뭐하는 짓이고. 그건 맨날 먹는 음식이잖아. 이런데 와선 평소 못 먹어본 걸 먹어야지. 촌스럽기는.”
촌스럽다는 말에 자극을 받는다. 다시 접시를 들고 새로운 음식 앞에 선다.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색다른 음식 몇 가지를 집는다. 맛깔스럽게 보인다. 그러나 내 미각을 흔들진 못한다. 결국, 나는 막장 한 숟가락을 퍼 담고 나물과 쌈 종류에 밥을 수북이 담아온다. 촌스럽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 내 입맛을 돋우어 주는 것은 어려서부터 길든 그 맛뿐이니까.
입맛을 말하니 생각나는 것이 있다. 그와 나는 너무 다른 입맛을 가지고 하나가 됐다. 그는 어부의 아들이고, 나는 농부의 딸이다. 그는 생선을 좋아했고, 나는 나물을 좋아했다. 그는 생선이 없는 식탁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나물이 없는 식탁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나물을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그의 젓가락에 외면당한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던 갓김치였으니 말해 무엇 하랴.
처음에는 두 종류의 반찬이 식탁에 올랐다. 그러나 점점 사라져가는 반찬은 내가 좋아하는 유의 반찬이었다. 그나마 입이 짧은 내가 자꾸 남아도는 음식을 먹기란 더 입맛을 떨어지게 했으니 차라리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채우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싫어함에도 끊임없이 식탁에 올린 것은 갓김치였다.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유일한 것이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간다고 한다. 그건 마음뿐이 아니라 외모까지도 해당한다. 나이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말과 흡사할 것이다. 중년이 되면 외모도 마음에서 우러나와 완성된 하나의 인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는 그래서 습관은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결국 우리 인생이 된다는 말은 진리이다. 그렇다면, 부부가 닮는다는 것은 같은 생각과 꿈을 가지고 한 방향을 오래도록 함께 바라본 까닭일 것이다.
우리 부부가 맛으로 하나가 되기까진 17년이 걸렸다. 갓김치의 특이한 향을 견디지 못하던 그가 올해 들어, 갓김치의 맛을 알게 됐노라며 갓김치 예찬론자가 되고 말았으니…. 매운탕의 비린내를 역겨워하던 내가 둘째를 가지고 심한 입덧을 치르는 와중에 매운탕의 시원한 국물의 진미를 알게 된 것처럼 그가 비로소 갓김치의 절묘한 맛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부부의 가장 큰 합일이다.
둘은 자연스럽게 입맛도 닮아가고 모습도 닮아가고 삶의 방식도 닮아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 길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길든다는 것은 익숙해진다는 것이요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다.
길든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어니스트가 큰 바위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사상이 일상과 조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듯 음식의 맛도 인생의 맛도 나의 길듦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접시를 들고 낯선 음식 앞에 다시 선다. 또 다른 음식에 내 입맛을 길들이기 위해.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